돔 페리뇽 2013, 맛만큼 상큼한 이야기 꽉차
프랑스 와인 망빈의 해에 홀로 빛나
함께 한 삼치 어만두와 탄탄한 조화 뽐내

[블록미디어=권은중 전문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샴페인하면 으레 돔 페리뇽을 떠올린다. 돔 페리뇽(Dom Pérignon)은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격인 루이비통 그룹(LVMH)이 운영하는 와이너리다. 그만큼 마케팅이 능수능란하다.
거기에 피에르 페리뇽이라는 시각장애인 수사가 18세기 세계 최초로 샹파뉴 베네딕틴 오빌레어 수도원에서 샴페인을 발견해 생산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힘을 쓴다. 그가 샴페인을 처음 발견하고 “입안에서 은하수가 터진다”라고 멋진 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가 한 말인지 후세가 만든 말인지는 불분명하다. 돔은 도미누스(Dominus)의 약자로 수도원장을 뜻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멋진 스토리와 감각적인 명품 마케팅 덕분에 돔 페리뇽이 가장 낮은 단계의 블랑 라인이 보통 병당 30만원부터 시작한다. 비싸다. 가성비를 우선 따지는 나로서는 내돈을 내고는 거의 사지 않는 와인 가운데 하나가 돔 페리뇽이다. 마실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는 않지만 굳이 동양의 여인들이 오픈런을 해서 줄을 서는 루이뷔통사의 주가를 내가 나서서 올려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신년회까지 4번이나 돔 페리뇽을 마실 기회가 있었다. 그것도 모두 2013년 빈티지였다. 거의 매주 마시다보니 2013년 돔 페리뇽의 매력에 푹 빠졌다. 먼저 놀랐던 게 수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풋풋하다는 점이었다. 숙성을 오래하는 샴페인인데 원숙미보다는 풋풋함이라니 의아했다.
샴페인은 3가지 포도를 블렌딩한다. 샤도네르는 기품과 산도를, 피노누아는 바디감을, 피노 뮈니에는 향을 준다. 하지만 돔 페리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종인 피노 뮈니에를 넣지 않고 샤도네르와 피노 누아로 만든다. 레드 와인 품종인 피노 누아는 껍질이 얇고 병충해에 민감해 재배가 까다로운 포도 품종이다. 피노 누아의 북방한계선이 샴페인의 고장인 프랑스 북부 샹파뉴다. 그만큼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고급 샴페인들은 바디감을 주기 위해 피노 누아를 많이 쓴다. 샤도네르를 많이 쓰는 샴페인에 견줘 강건하다(샤도네르 100%를 쓰는 샴페인을 블랑 드 블랑이라고 한다). 아무리 피노 누아를 많이 썼다고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상큼하다니. 이 정도면 몇년 뒤에 마셔도 될 만한 저력이었다.

생각할 거리를 주는 돔 페리뇽 2013
그런데 2013 돔 페리뇽은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줬다. 2013년에 양조됐어도 이 와인이 풀린 것은 2021년부터다. 돔 페리뇽은 1년이 걸려 빚은 뒤, 병에서 7년을 숙성해서 내놓기 때문이다. 보통 고급 샴페인이 36개월을 숙성하는 것에 견줘 긴 시간이다. 하지만 오래된 빈티지의 샴페인들은 거품이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돔 페리뇽은 짱짱했다. 긴 숙성이 주는 원숙미보다는 발랄함이 느껴졌다. 색깔도 레몬즙처럼 밝고 가벼웠다.
샴페인은 주로 빈티지와 논빈티지로 나뉘는데 논빈티지 샴페인은 여러해 포도 발효액을 섞어서 샴페인을 만든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교적 일정한 맛을 유지한다. LVMH사를 대표하는 모엣 상동이 논 빈티지 샴페인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빈티지 샴페인은 특정 해에 경작된 포도만으로 빚는다. 포도 경작이 안 좋은 해에는 당연히 빈티지를 건너 뛴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3년은 프랑스 와인 업계에는 재앙인 해였다. 싹이 트는 4월까지 서리가 내리고 여름철에는 홍수를 겪어서 포도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 이름하여 망빈(망한 해라는 뜻. 한자 망할 ‘망’자에 해를 뜬하는 빈티지를 합친 한국식 은어)의 해였던 것이다. 어느 정도 망빈이나면 보르도 5대 샤토의 2014년 와인 가격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2013년 와인은 50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샴페인이 이 해에 타격이 없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그렇게 행운 속에서 빚어진 것이 돔 페리뇽 2013이다.
음식과의 조화도 뛰어났다. 중국식 삼치 어만두와 함께 마셨던 맨 마지막 돔페리뇽 2013의 질감이 기억난다. 중국식 어만두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탓이었다. 삼치가 비린내가 적어 회로도 먹는 생선이지만 조리과정에서 만두를 할만큼 비린내를 잡기는 쉽지 않은 듯 했다. 보통 어만두의 생강과 참기름 냄새가 강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하지만 먹는 입장에서 보면 삼치 비린내가 이런 강한 향신료 맛보다는 훨씬 낫다. 그만큼 재료 향과 양념 향의 오묘한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음식이 어만두다.
하지만 이날 먹은 어만두는 향이 괜찮았다. 두꺼운 피라서 살짝 걱정했는데 이 피가 생선향과 육즙을 잘 잡아주었다. 얇은 피 어만두가 갖지 못한 장점이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오는 게 아쉬울 정도였다. 함께 마신 돔 페리뇽도 어만두 맛을 돋구었다. 샴페인의 시트러스와 아몬드 향은 생선 향과 만두피 전분의 단맛을 감싸며 긴 여운을 남겼다. 발랄한 줄만 알았던 2013년의 샴페인이 가진 원숙미였다.
그저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쯤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진 여인이 곁에 있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재앙적인 2013년 다른 포도밭의 비극을 보고 자라서였을지도 모르겠다. 식물도 나름의 소통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 와인에 가진 내 편견도 살짝 거두어지는 순간이었다. 맛과 스토리가 주는 힘이었다. 돔페리뇽2013은 입안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은하수를 터트리는 와인이었다.
그러면서 2003년 돔 페리뇽의 맛이 궁금해졌다. 2003년은 샴페인이 망빈이었던 해였다. 포도싹이 날 때 혹한이 몰려왔다고 한다. 남의 비극을 보고 자란 2013처럼 탄생부터 시련을 겪은 2003 돔 페리뇽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호기심이 들었다. 적어도 2003년 돔 페리뇽은 자식이 명문대에 갔다고 혹은 AI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아무렇게나 따서 콜라 마시듯 마시는 샴페인은 아닐 거 같다.
권은중 전문기자는 <한겨레> <문화일보> 기자로 20여 년 일하다 50세에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학교(ICIF)’에 유학을 다녀왔다. 귀국 후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음식과 와인 칼럼을 써왔고, 관련 강연을 해왔다. 『와인은 참치 마요』, 『파스타에서 이탈리아를 맛보다』 등의 저서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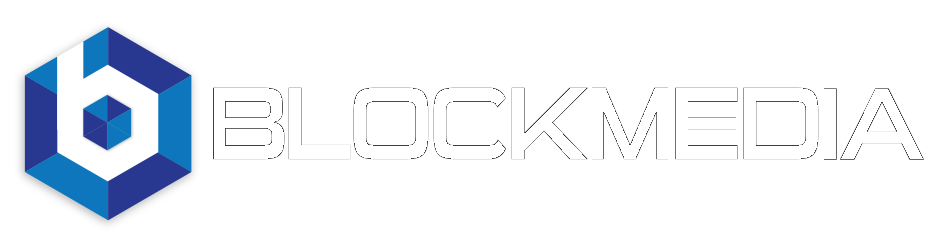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머릿속’에서 은하수가 반짝이네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머릿속’에서 은하수가 반짝이네](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smush-webp/2025/02/KakaoTalk_20250201_115458327-1200x1600.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