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쉬라를 하나도 못맞춰
로버트 파커 100점·1999년 와인도 몰라봐
보르도·부르고뉴에 쏠린 와인 취향 반성해

[블록미디어=권은중 전문기자] 호주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이 쉬라즈(shiraz)다. 프랑스에서는 쉬라(syrah)라고 한다. 원산지는 프랑스 남부 론이지만 호주와 프랑스의 쉬라즈는 스펠링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
내가 와인을 처음 마시던 시절, 호주 쉬라즈를 많이도 마셨다. 호주 쉬라즈가 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이다. 호주 쉬라즈는 후추와 향신료 맛이 확 느껴진다. 하지만 와인을 많이 마시다보면 쉬라즈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 강렬함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호주 쉬라즈 대신 가끔 프랑스 론의 힘찬 쉬라를 먹기는 한다. 하지만 북부 론의 쉬라는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조금 저렴한 남부 론의 쉬라를 먹게 된다. 그런데 남부 론의 쉬라는 쉬라 단일 품종을 쓰지 않고 여러 품종을 섞기 때문에 쉬라에 대한 인상은 그르나슈 무르베드르와 같은 다른 남부 프랑스 품종과 함께 섞여버린다. 그래서 쉬라는 이내 개성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며칠 전 흥미로운 와인 모임이 있었다. 이곳은 와인 모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된다. 블라인드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호기심으로 한번 가보았다.
먼저 입가심으로 화이트 2병이 나왔다. 화이트 와인을 꽤 좋아하는 나는 블라인드로 나온 화이트의 나라와 품종을 맞췄다. 생산년도를 뜻하는 빈티지는 조금 틀렸는데 첫번째 마셨던 뉴질랜드 쿠뮤 리버 코딩턴 샤도네이(Kumeu River Coddington Chardonnay)가 워낙 농밀해서 조금 오래된 빈티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2020년 와인이었다. 북섬 오클랜드 인근에서 재배되는 샤도네이로 만든 쿠뮤 리버 코딩턴은 프랑스 부르고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섬세하고 옹골찼다. 헤이즐넛향이 올라와서 더 부르고뉴 같았다.
화이트 와인 두병을 모두 맞춰 의기양양했지만 나는 레드 와인의 블라인드는 한병을 제외하고는 모두 틀렸다. 출제자의 의도가 쉬라(쉬라즈)였다. 그런데 쉬라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했다. 미국 몰레(Morlet)의 쉬라즈는 피노 누아나 메를로 같았다. 난 프랑스의 메를로 혹은 미국의 피노 누아를 고민하다가 프랑스 보르도 우안의 메를로를 선택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틀렸다. 피노 누아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쉬라즈의 이런 섬세함이 있을 줄 몰랐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내가 정통적인 쉬라와 쉬라즈도 못 맞추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맛있던 것은 호주 아스트랄리스(Astralis)의 쉬라였는데 무려 1999년 빈티지였다. 20세기 와인이었다. 분명히 호주 쉬라즈의 후추맛을 느꼈는데 맞추지를 못했다. 나는 26년이 된 와인이 주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오래된 향 때문에 바르베라의 10년쯤된 된 빈티지의 와인이라고 생각했다. 첫맛이 오래된 숙성취였고 그 다음으로 베리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찜찜했다. 분명 뒤끝에는 후추의 여운이 길었던 탓이다. 유고 이민자들이 남부 호주에 설립한 아스트랄리스는 호주 쉬라의 또다른 결을 대표한다. 아스트랄리스는 호주 와인인데도 쉬라즈를 쓰지 않고 쉬라를 쓴다. 프랑스 오크통에 숙성하며 프랑스적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병에 쉬라즈가 아니라 쉬라라고 명기한다.
하지만 나는 프랑스 북부 론을 대표하는 쉬라 와인인 에르미타주도 역시 맞추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와이너리인 이기갈(E.Guigal)의 고가 와인인 엑소 보또 에르미타쥬 2012였다. 10년이 넘었는데도 너무 명징했다. 호주의 아스트랄리스 1999의 오래된 향취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였다.
그래서 나는 이 와인을 이탈리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BdM)로 착각했다. 역시 후추향이 여운으로 남았지만 너무 깔끔했다. 나는 그래서 10년 미만의 젊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로 착각했다. 이기갈 에르미타주는 빈티지가 2012년이었는데 청년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앞으로 20년 숙성을 더 해도 될 것 같았다. 이 와인 2009년 빈티지는 미국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로부터 100점 만점을 맞기도 했다. 그 저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맛이었다.
단 3병의 쉬라를 불라인드 테스트했는데 나는 쉬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초보자가 되어 버렸다. 수많은 평론가들이 극찬을 한 쉬라와 쉬라즈도 내 혀가 감별해내지 못했다.
나는 이 쉬라 와인들을 마시면서 어릴 적 큰 감흥없이 세계 명작이어서 의무적으로 읽었던 표토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이 생각났다. 이름도 낯설고 어둡고 침침한 묘사가 많아서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소설이었다. 같은 러시아 문호인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에 견줘 더 지루했던 그의 소설이 떠올랐다. 지금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가난한 사람들』을 천천히 읽어봐야 한다는 마음의 빚이 늘 가슴 한켠을 누르고 있다. 읽어도 읽었다고 하지 못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은 마셔도 마셔봤다고 말하기 어려운 쉬라를 닮았다.
그러고보니 최근 몇년간 프랑스의 보르도와 부르고뉴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바롤로만 마신 것 같았다. 블라인드를 해보니 나의 와인 편향이 여실이 드러났다. 영하 10도의 맹추위에 모진 바람을 맞으며 인천까지 가길 잘했다는 뿌듯함이 들었다. 와인은 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권은중 전문기자는 <한겨레> <문화일보> 기자로 20여 년 일하다 50세에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학교(ICIF)’에 유학을 다녀왔다. 귀국 후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음식과 와인 칼럼을 써왔고, 관련 강연을 해왔다. 『와인은 참치 마요』, 『파스타에서 이탈리아를 맛보다』 등의 저서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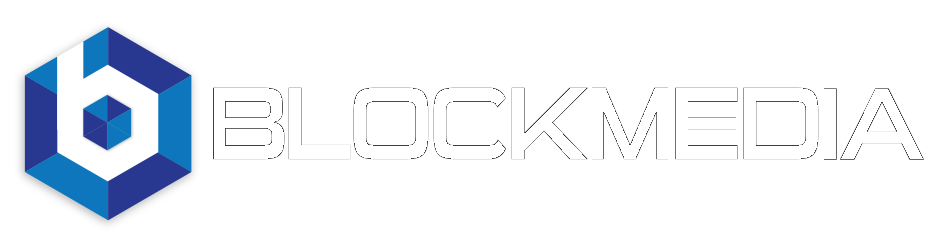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쉬라의 명징한 죽비소리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쉬라의 명징한 죽비소리](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smush-webp/2026/02/KakaoTalk_20250209_092027545-1200x825.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