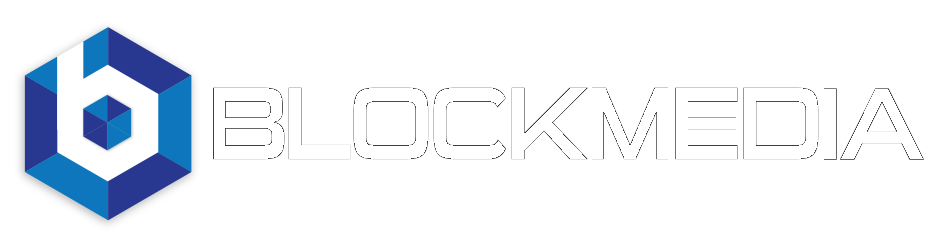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2025년, 월가는 블록체인 혁신의 한가운데 서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 거인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금융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 토큰화(RWA)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누가 금융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게임이다.
#규제와 유동성, 월가의 상반된 블록체인 전략
과거 월가의 금융 시스템은 철저히 중앙 집중화된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정보 접근성과 금융 서비스의 민주화를 촉진하며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월가의 금융사들은 ‘규제 친화적인 통제 모델’과 ‘개방형 유동성 모델’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① JP모건·뉴욕멜론은행 – 프라이빗 블록체인 전략
JP모건은 2024년 오닉스(Onyx) 블록체인을 통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결제가 이 블록체인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철저한 허가형 구조를 유지한다. 소수의 금융기관만 네트워크 노드 운영 권한을 가지며, 거래 정보는 외부에 공유되지 않는다.
뉴욕멜론은행 역시 기관용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를 구축했지만,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되지 않은 폐쇄형(프라이빗) 생태계다. 이 같은 전략은 금융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존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폐쇄형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개방성과 글로벌 유동성 확보에는 한계를 보인다. JP모건은 “온체인 미국 국채 토큰은 특정 기관 간에서만 거래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유리 캐비닛에 갇힌 골동품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② 블랙록·골드만삭스 – 퍼블릭 블록체인 적극 활용
반면, 개방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 금융기관들은 퍼블릭 체인을 선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블랙록의 BUIDL 토큰화 펀드다.
BUIDL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된 머니 마켓 펀드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 청산이 가능하며, 담보 대출과 2차 거래까지 지원한다. 이는 기존 금융과 Web3 금융의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더리움과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일부 헤지펀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퍼블릭 체인은 규제 당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제도권 금융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하이브리드 체인: 온도 체인(Ondo Chain), 월가 패권 전쟁의 ‘균형자’ 될까?
JP모건과 뉴욕멜론은행은 규제 내에서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블랙록과 골드만삭스는 유동성 확대를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바로 Ondo Chain이다. 온도 파이낸스는 허가형 노드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했다. 프랭클린템플턴 등 대형 금융기관이 검증자로 참여해 규제 준수를 보장하면서도, △이더리움·솔라나 등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즉, 전통 금융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면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 레이어 2(L2), 금융 패권 경쟁의 또 다른 변수
온도 체인은 기존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지만, 기관들이 이를 대규모로 채택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Layer 2(L2)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업계에서 딥시크(DeepSeek)가 비용 혁신 필요를 가져온 것처럼 블록체인에서는 L2가 거래 비용 절감과 확장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 이더리움 L2 네트워크는 칸쿤(Cancun) 업그레이드 이후 거래 비용을 97% 이상 절감하며 Web3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Base는 Web3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되며 빠르게 성장 중이며, 비자(Visa)와 스트라이프(Stripe)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들도 L2를 활용해 암호화폐 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L2는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니(Sony)와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같은 기존 기업들은 독자적인 L2 구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들이 Web3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누가 미래 금융의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결국, 월가의 블록체인 실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누가 미래 금융을 지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다. JP모건 체이스의 프라이빗 체인 전략, 블랙록의 퍼블릭 체인 기반 ETF, 비자의 L2 결제 시스템, 온도 체인의 하이브리드 실험까지, 각 금융기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금융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동안, 디파이(DeFi)는 조용히 그들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파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금융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금융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월가의 블록체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