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은중 기자]

고가의 몽라셰 마시러 덜컥 강원 고성행
정작 와인보다 삼세기 담백함에 끌려
와인, 명성보다 함께 한 음식이 더 중요
[블록미디어 권은중 전문기자] 전 세계 화이트 와인 가운데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두 품종이다. 하나는 독일 리슬링이고 하나는 프랑스 부르고뉴 샤르도네다.
와이너리별로 보면, 리슬링은 독일 에곤 뮬러의 최고가 와인 평균 가격이 1만5000달러(한화 2200만원)쯤이다(와인 서처 2024년 기준). 샤도네르는 도멘 도브네의 슈발리에 몽라셰가 가장 비싼데 병당 평균 가격이 2만 3000달러(한화 3300만원)다. 샤르도네가 리슬링에 견줘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에곤 뮬러의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도 전체 순위로는 5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고가 화이트 와인 1~10위까지를 보면 9개가 부르고뉴 샤르도네이다.
1위부터 10위까지 랭크된 고가 화이트 와인 가운데 8개의 생산지는 각각 몽라셰(7개)와 뫼르쏘(1개)였다(나머지 1개인 코로통 샤를마뉴도 부르고뉴에 있다. 이곳도 몽라셰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져 있다. 코르통 샤를마뉴 역시 ‘코트 드 본’이라는 같은 코뮤네에 있다). 뫼르쏘는 몽라셰의 북동쪽에 바로 붙어 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이 나오는 곳은 몽라셰라는 마을이다.

몽라셰, “무릎을 꿇고 마셔야” 격찬 받아와
이 마을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은 예로부터 유명했다. 『삼총사』를 쓴 프랑스 소설가 알렉산드르 뒤마(Alexandre Dumas)는 몽라셰 와인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마셔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몽라셰의 맛을 “고딕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파이프오르간 소리와 같은 느낌이다”라고까지 격찬했다. 레드 와인도 이런 상찬을 받은 와인이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와인이 갖는 매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몽라셰는 내가 좋아하는 와인 상위에 랭크돼 있다. 몽라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부산 제주라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원도 고성이었다.
안그래도 나는 고성을 한달에 한두번씩은 다니던 터였다. 생선 때문이었다. 선천적으로 육고기보다는 물고기를 사랑하는 나는 시시때때로 회를 먹어야 하는 회 마니아다. 그런데 고성에서 ‘삼숙이’(표준어 삼세기)를 먹고 나는 삼세기의 팬이 됐다. 쏨뱅이과 물고기인 삼세기는 몸길이 40cm 정도 자라는 물고기다. 커다란 입과 납짝한 몸통 그리고 가시로 이루어진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 탓에 쏨뱅이나 쑤기미와 함께 가장 못생긴 물고기에 꼽힌다.
담백한 회도 최고였지만 매운탕의 맛이 너무도 깊고 그윽했다(전복치, 놀래미, 도다리도 맛나긴 한데 삼세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서울에서도 가끔 삼세기 매운탕을 먹으려고 강화도까지 가곤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마침 고성에 사는 후배가 자기 집에 퓔리니 몽라셰가 입고됐으니 마시러 오라는 것이었다. 조건은 삼세기와 도다리 회를 사라는 것. 몽라셰 가격이 20만원 조금 못 미치니까 내가 회를 쏘아도 등가교환이었다. 바로 지난 8일 약속을 잡고 고성으로 향했다. 서울의 날씨는 영하 11도. 고성도 영하 7~8도인 추운 날씨였다. 출발하기 이틀전인 6일 전국적으로 눈이 많아서 태백산맥을 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고성의 하늘은 여름처럼 푸르렀다. 회를 먹기 딱 좋은 날씨였다.
후배가 챙겨놓은 몽라셰는 도멘 바슐레 모노(Domaine Bachelet Monnot)의 퓔리프 몽라쉐였다. 도멘 바슐레 모노는 설립된 지가 20년쯤인 신생 와이너리다. 로마네 콩티를 비롯해 수백년 연혁의 도멘이 즐비한 부르고뉴지만 이 와이너리는 신생치고는 꽤 이름을 얻고 있다. 와이너리 설립 뒤 첫 작품으로 선보인 와인이 바로 퓔리프 몽라쉐였다. 처음 만든 와인이 워낙 맛있어서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평론가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레드도 생산하는데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비노 4.4인데 삼세기와는 안 어울려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돼 차갑게 먹었을 때는 레몬과 시트러스 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노란 사과와 배 같은 과일 향이 났다. 실내 온도 탓에 조금 더 따뜻해지자 바닐라와 열대과일향과 미네랄이 느껴졌다. 보디감이 섬세하고 하늘거렸다. 비비노 평점이 4.4나 되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와인이 이렇게 섬세하다보니 삼세기 회를 그래서 계속 고추냉이와 간장만으로 먹어야 했다. 약한 바디감 탓에 간장향도 이내 거북했다. 이 정도의 갸날픈 바디감이라면 삼세기 회를 세비체로 해서 먹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나중에는 레몬즙과 소금을 찍어서 먹었다. 그러다보니 바디감이 강건한 뫼르쏘가 그리웠다.
삼세기와 도다리를 다 먹고 바로 매운탕이 나왔다. 심심하게 끓인 매운탕은 겨울 고성의 칼바람 소리를 잊을 만큼 뜨겁고 시원했다. 당연히 우리는 술을 바꿔야 했다. 고성쌀로 빚은 증류 소주 달홀진주 25도로 갈아탔다. 뜨겁게 뜨겁게 변신한 삼세이의 향이 그제서야 제대로 느껴졌다.
과문한 탓인지 나는 몽라셰를 먹고나서 “아 진짜 좋았다”라고 한 적이 퍽 드물다. 반대로 몽라셰보다 한등급 낮은 밭들에서 나는 뫼르쏘는 언제나 최고였다. 내 입맛이 특이해서 그런지 최고급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에 더 마음이 편안한 것일까? 아니면 섬세함을 강조하는 부르고뉴 몽라셰의 트렌드가 한국인의 입맛과 엇박자를 내는 걸까?
몽라셰에 대한 아쉬움이 살짝 묻어나니 늘 의젓하게 날 반겨주는 고성 물고기 ‘삼숙이’는 더 더 믿음직해졌다. 고성에 올 때마다 먹는 삼세기는 회도 회지만 매운탕이 너무 맛있어서 놀란게 한다. 기시감이나 익숙함으로 질리기는커녕 매번 신선한 울림을 준다.
눈폭풍이 그친 영하의 날씨에 태백산맥을 넘어 고성에 온 것은 몽라셰 때문이었지만 결국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와인 몽라셰가 아니라 물고기 삼세기였다. 뒤마를 약간 패러디해본다. “고성 ‘삼숙이’는 새벽에 고찰에서 울려 퍼지는 목어소리 같이 깊고 맑다.”
권은중 전문기자는 <한겨레> <문화일보> 기자로 20여 년 일하다 50세에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학교(ICIF)’에 유학을 다녀왔다. 귀국 후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음식과 와인 칼럼을 써왔고, 관련 강연을 해왔다. 『와인은 참치 마요』, 『파스타에서 이탈리아를 맛보다』 등의 저서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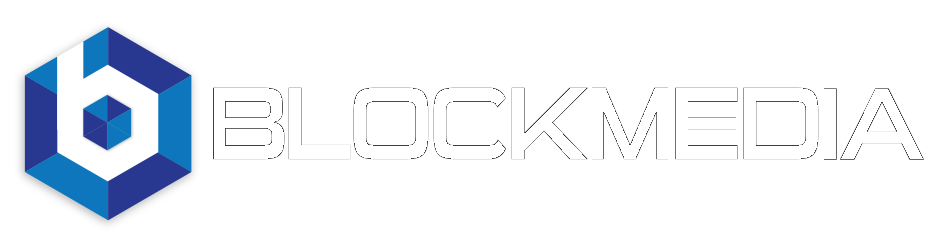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몽라셰 대신 삼세기에 무릎을 꿇다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몽라셰 대신 삼세기에 무릎을 꿇다](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6/02/KakaoTalk_20250215_1142448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