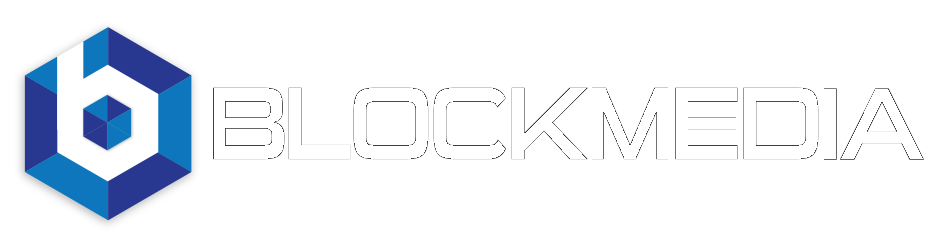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블록미디어 정윤재] 2077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하는 MEV(Maximal Extractable Value)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사용자 경험까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앱 자율 시퀀싱(App-Specific Sequencing, ASS)’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이 만든 MEV를 직접 가져오지 못한 채 검증자나 시퀀서에게 수익을 넘겨주는 구조에 놓여 있다. ASS는 앱이 자체적으로 트랜잭션 순서를 결정함으로써, △불공정한 순서 지정 △샌드위치 공격 △네트워크 혼잡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다.
‘MEV’란 Maximal Extractable Value의 약어로, 트랜잭션의 순서를 추가, 제외, 재정렬 함으로써 채굴자(Miner) 또는 검증인(Validator)이 블록 보상 및 거래 수수료 외 블록 생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 가치를 의미한다.
ASS 모델을 도입한 앱은 퍼블릭 메모풀이 아닌 자체 메모풀에서 트랜잭션을 수집하고, 앱 고유의 시퀀서를 통해 순서를 정한 뒤, 이를 번들 형태로 블록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MEV는 앱 내부로 귀속되며, 사용자에게도 더 나은 체감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앱체인 대신 ASS 선택해야 하는 이유
ASS는 기존의 앱체인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구현 비용을 갖는다. 앱체인을 구축하면 △RPC 운영 △네이티브 토큰 발행 △보안 감사 △브릿지와 오라클 연동 △개발자 도구 구성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반면 ASS는 기존 L1 또는 L2 위에서 시퀀서만 따로 운용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적다.
또한 ASS는 자산이 원래의 체인 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브리지 없이 유동성 접근이 가능하며, 자산 동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L2와 달리 사용자는 거래 체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보안 기능 없이 직접 실행 환경에 의존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ASS 도입 사례와 시장 흐름
ASS 모델을 실제로 도입한 사례로는 소렐라랩스(Sorella Labs)의 앙스트롬(Angstrom)이 있다. 유동성 공급자(LP)가 손실을 회수할 수 있도록 LVR 경매 및 배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샌드위치 공격이나 슬리피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원가 기반 경매 구조를 택했다. 앙스트롬은 자체 노드를 통해 번들을 구성하며, LP에게 수익을 재분배하고 사용자에게 공정한 체결 가격을 제공한다.
또 다른 예는 패스트레인(Fastlane)의 아틀라스(Atlas) 프로토콜이다. 아틀라스는 커스텀 순서 경매를 통해 특정 앱에 맞는 거래 순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 집중형 솔버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2077 리서치는 “ASS는 MEV 회수, 사용자 보호, 수익 재분배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기제로, 앱이 자체적으로 가치를 보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앱체인처럼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 체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앱만의 순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ASS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ASS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MEV 시장에서 공정성·투명성·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 블록미디어 리서처들이 쏙쏙 뽑아 전하는 시장 이슈 ‘아무거나 리서치’ 텔레그램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