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문예윤 인턴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은 거래 규모가 크고 투자자층도 활발하지만,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닫힌 시장’으로 인식된다. 보수적인 금융당국 태도와 불명확한 법체계 등이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폐쇄성이 해외 기업뿐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혁신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1629만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국민 10명 중 3명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참여 열기에 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 프로젝트 “한국 시장, 잠재력 높지만 진입은 거의 불가”
한국은 아시아 시장 전략에서 핵심 국가로 꼽힌다. 비트코인 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달러에 뒤지지 않는다. 시장조사기관 카이코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원화는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인 법정통화로 거래 규모는 약 4560억달러(약 667조17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 달러 거래량(4550억달러·665조711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풍부한 거래량에 더해 빠른 IT 인프라, 적극적인 투자자층, K-콘텐츠 기반 수요도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한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한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 역량 있는 인재가 많고, 시장 잠재력도 크다”면서도”한국은 반드시 진출하고 싶은 핵심 시장이지만, 규제 요건이 불확실하고 복잡해 실제로 사업을 펼치기엔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높은 시장 잠재력을 의식해 △바이낸스 △후오비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명계좌 요건과 불확실한 인허가, 법적 리스크에 가로막혀 다수는 철수하거나 우회 전략으로 돌아섰다. 일부는 원격 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바이낸스는 2021년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고 후오비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23년 말 철수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초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간담회를 취소하며 공식 진출을 접었다.
업권법, 수 년째 제자리⋯국내 인재·자본 모두 해외로 유출
외국계 기업들이 규제 장벽에 막혀 발을 들이지 못한 상황은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디지털자산 발행·초기 유통(ICO) 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고, 당국의 부정적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과 토큰 발행 과정에서 제약을 겪고 있다.
결국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역시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발한 뒤, 법인 설립과 토큰 발행은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불명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전 허용보다 사후 규제 중심의 정책 구조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약은 대기업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플랫폼이나 지갑 서비스 등 웹3 사업에 뛰어들었던 주요 기업들도 최근 들어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는 한때 NFT 마켓플레이스 ‘클립드롭스’와 지갑 서비스 ‘클립(Klip)’을 운영하며 웹3 생태계 확장에 나섰지만 사업을 점차 축소했고 최근 해당 사업을 안랩블록체인컴퍼니에 넘겼다.
“웹3 정책, 글로벌 흐름과 역행”⋯기회 놓치는 한국
국내에서는 이처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웹3 산업 전반이 제도적 제약에 부딪혀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결제서비스법(PSA)을 통해 디지털 토큰 사업자를 인가하고 있으며, 홍콩은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도 합법화했다. 일본은 총리 직속 웹3 정책 본부를 운영하고 증세 완화와 법제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ICO 금지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NFT 자산 분류 미정 등으로 정책 진입 속도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가 시장을 가로막는 동시에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웹3 사업은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며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하지만 사업은 외국에서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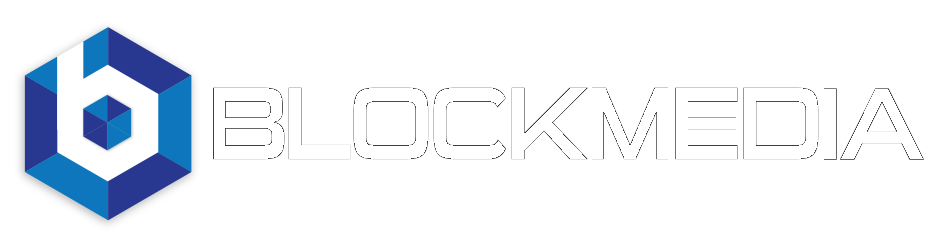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韓거래소가 위험하다②] ‘닫힌 코인 시장’⋯글로벌도 토종도 떠난다 [韓거래소가 위험하다②] ‘닫힌 코인 시장’⋯글로벌도 토종도 떠난다](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5/04/image-2-1200x686.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