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전격 시행했다. 전 세계는 일제히 1930년대의 악몽을 떠올렸다. 바로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다.트럼프의 발표 직후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스무트-홀리의 악몽이 되살아났다”고 썼으며 파이낸셜타임즈도 “후버의 실패를 반복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보호무역의 부활’이라는 공포 속에 세계는 묻고 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의 원흉이었을까?”
“그리고 100년 뒤 미국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
#붕괴는 관세 이전에 시작됐다
많은 이들이 스무트-홀리법을 대공황의 주범으로 지목하지만, 미국 경제는 이미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이라 불린 이날, 뉴욕 증시는 붕괴했다. ‘광란의 20년대’로 불리던 호황기 동안, 미국인들은 대출로 주식 투자에 열중했고 마진 거래가 일상이었다. 그러나 주가는 정점을 찍은 뒤 곤두박질쳤고, 패닉에 휩싸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매도에 나섰다. 주식시장 붕괴 직후 은행의 연쇄 도산이 발생했다. 당시 예금보험조차 없던 미국에서 은행 파산은 곧 개인들의 생계 파탄으로 이어졌다. 소비와 투자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1930년 봄, 실업률은 이미 9%를 넘어섰고, 미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었다.
#농민 보호에서 산업 로비로… 변질된 법안

스무트-홀리법의 출발은 단순했다. 1929년 대선에서 당선된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공화당은 농업 위기의 해결책으로 보호무역을 꺼내들었다.초기 법안은 농산물에 한정된 관세였지만, 의회 로비에 나선 제조업계의 압력으로 공산품, 공업 원자재, 가공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결국 2만여 개 품목에 대해 평균 42%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공화당은 이를 ‘미국산 보호’라 포장했지만, 민주당과 자유무역론자들은 “세계 경제를 절벽으로 밀어 넣는 어리석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찰스 맥네리(Charles L. McNary)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친구와 이웃을 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고했고, 민주당과 자유주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수출길을 스스로 막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 언론, 산업계가 함께 외친 경고
당시 미국 언론들은 보호무역의 재앙을 예고했다. 1930년 6월 14일,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세계무역 붕괴와 글로벌 보복관세 전쟁”을 경고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이 붕괴된 상황에서 무역까지 막으면 기업과 금융계는 숨 쉴 구멍조차 사라진다”고 썼다. 시카고 트리뷴은 “보호무역의 장벽은 벽이 아니라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산업계도 반기를 들었다. GM, 포드, 듀퐁, GE, US스틸 등 주요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산업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례적으로 공화당의 전통 지지 기반마저 스무트-홀리법 반대 대열에 가세한 것이다.
#무너진 수출, 무너진 미국 경제
법안 서명 직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교역국들은 즉각 보복관세를 응수했고, 미국의 수출은 반 토막 났다. 미국 경제 역사학자 존 스틸 고든에 따르면 1929년 세계 무역액은 총 360억 달러였으나 1932년에는 120억 달러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액도 52억 4100만 달러에서 11억 6100만 달러로 78% 급감했다. 미국 실업률은 1930년 말 15%, 1932년 25%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후버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명을 이어갔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1932년 대선에서 후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참패했고, 스무트-홀리법은 이후 “역사상 최악의 보호무역 실책”으로 평가받았다.루스벨트는 취임 직후 무역협정법(RTAA)을 통해 주요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고, 이는 자유무역체제의 초석이 됐다.
#100년 후의 데자뷰 — 트럼프와 스무트-홀리
95년이 지난 2025년 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미국에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역시 25% 관세의 대상이 됐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애플, GM, 마이크론 등 수출 의존 기업들의 주가는 이틀 만에 5~8% 급락했다.
피치레이팅스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에서 22%로 급등했다. 1910년대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데베어 그룹의 나이절 그린은 “세계무역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프랑스 INSEAD의 안토니오 파타스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가 겹칠 것”이라고 우려했고, “세계는 모두에게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가 낳은 보호무역의 부활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다시 꺼낸 이유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다. 재선 직후, 트럼프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 결집과 중서부 제조업 표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929년 후버 대통령이 농민 표심을 의식했던 것처럼, 트럼프 역시 제조업 쇠퇴와 디플레이션을 핑계로 보호무역의 깃발을 들었다. 하지만 시장과 학계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코넬대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트럼프는 시스템을 조정하는 대신, 규칙 그 자체를 부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은 해법인가 재앙인가
후버와 트럼프, 100년의 간극에도 둘은 같은 선택을 했다. 정치적 압박,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 속에서 세계 경제의 근간인 자유무역 체제를 뒤흔든 것이다.
트럼프는 말했다. “미국이 먼저 이길 것이다.”
그러나 100년 전 후버 역시 같은 말을 했다.
결과는 세계무역의 붕괴, 미국의 실업 대란이었다. 오늘의 세계는 후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을까, 아니면 다시 한 번 그 길로 들어서고 있는가. 자유무역으로 성장해 온 세계 경제는 지금 다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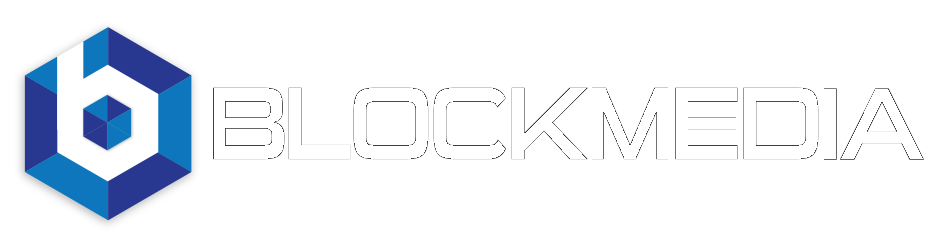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명정선의 톺아보기]스무트-홀리 2.0? 트럼프 관세의 역사적 데자뷰 [명정선의 톺아보기]스무트-홀리 2.0? 트럼프 관세의 역사적 데자뷰](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smush-webp/2026/04/20250403_트럼프-관세법-1200x800.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