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안팎된 칠레 최고의 레드 와인 대결
세나2014, 신대륙 특유 발랄함 느껴져
알마비바2019, 피망 허브 맛만 나
[블록미디어 권은중 전문기자] 와인 애호가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영아(嬰兒) 살해’라는 말이 있다. 영아는 갓 태어난 젖먹이라는 뜻이다. 영아살해는 그만큼 섬찟한 단어인데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는 자주 쓰는 말이다. 그만큼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일 것이다.
잘 만든 레드 와인은 숙성 잠재력이 보통 30년을 넘는다. 30년 넘어야 맛이 있다는 뜻이다. 병속에서 오랜 기간 3차 숙성(1차 숙성은 발효되면서, 2차 숙성은 오크통에서, 3차 숙성은 병에서 일어난다)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 담배, 흙냄새, 삼나무향이 생긴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빈티지가 오래 될수록 독특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30년이 지난 와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혹시 한국에서 접하는 20년 이상 된 와인들은 대부분 개인 애호가들이 셀러에 놔뒀다가 들고 나오거나 외국 여행을 가서 사오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귀하다. 보통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와인의 상당수는 3~5년 지난 것들이다. 이런 어린 와인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와인 모임을 가보면 영아살해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세냐 vs 알마비바 대결의 승자는?
그런데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칠레의 두 최고봉 와인 가운데 한병을 영아살해 했다. 하나는 세냐(Sena)였고 하나는 알마비바(Almaviva)였다.
먼저, 세냐는 칠레 와인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와인으로 평가된다. 이 와인은 세계적인 와인 생산자인 칠레의 에두아르도 채드윅(Eduardo Chadwick)과 미국의 로버트 몬다비(Robert Mondavi)가 협력해서 만든 것이다. 로버트 몬다비가 아콩카구아 밸리를 보고 1960년대 나파벨리처럼 될 것으로 보고 1995년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아콩카구아 밸리는 이후 칠레 레드 와인의 심장부가 된다. 여기서 생산된 포도로 1997년에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메네르, 메를로를 기본으로 하는 세냐 1995 빈티지를 출시했다. 세냐는 칠레의 프리미엄 와인 생산의 효시가 됐다.
알마비바도 시기와 내용이 비슷하다. 알마비바는 프랑스의 와인명가 바롱 필립 드 로칠드(Baron Philippe de Rothschild) 가문과 칠레의 콘차 이 토로(Concha y Toro)와 손을 잡고 만든 와인이다. 알마비바는 처음에는 카베르네 쇼비뇽 까르메네르 카베르네 프랑 3품종으로 양조를 했다. 프랑스 보르도와 비슷한 블렌딩이다. 알마비바의 첫 빈티지는 1996년이다. 세냐보다 1년 뒤다. 칠레의 토양과 기후에서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을 선보이며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보르도 1등급 그랑 크뤼에 견줄만한 프리미엄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와인은 ‘칠레 와인은 싸구려’이라는 편견을 뚫고 차근차근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로버트 파커를 비롯해 유명 와인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칠레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성장했다. 칠레 와인의 주요 시장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와인은 지금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쟁쟁한 칠레 와인의 맞대결이라니. 당연히 긴장됐다. 하지만 세냐는 2014였고 하나는 알마비바 2019였다. 둘다 10년이 갓 넘었거나 10년이 안된 어린 와인이었다. 알마비바는 영아 수준이고 세냐는 겨우 젖을 뗀 와인쯤이었다. 나는 오늘 영아살해를 하는 것 아닌가 걱정됐다.
다행히도 세냐에겐 영아살해가 기우였다. 진한 보라색의 세냐를 한모금 마시는 순간 베리와 블랙커런트 향이 느껴졌다. 그냥 코르크만 따놓고 1~2시간 브리딩만 했는데도 쇼비뇽 블랑과 메를로의 특징과 칠레 토착 품종인 까르메네르의 장점이 느껴졌다. 하지만 섬세한 삼나무나 담배향 같은 특징은 마지막 잔을 마실 때까지 느끼지 못했다. 뒤로 갈수록 약간의 스파이시함과 민트나 허브향이 나면서 중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당연히 좀 더 있다 땄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다.
알마비바2019는 우려대로 맛이 입체적이 않았다. 피망과 허브 맛만 났다. 그래서 디캔터를 가지고 디캔팅을 두번이나 했다. 하지만 피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우리는 ‘영아살해’를 한 것이다. 예상을 했으면서도 태연하게 우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병당 가격이 40만원이 넘는데 말이다. 이 와인은 적어도 10년이 지난 2029년쯤에 먹거나 2030년대 먹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알마비바를 몇번 마셨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식이었다. 진한데 도무지 레이어를 느낄 수 없었다. 너무 빈티지가 영한 것만 마셔봤기 때문이었다.

알마비바, 디캔팅해도 안 열려
두 와인의 빈티지는 5년 차였다. 5년 차이가 그렇게 맛의 차이가 클까? 궁금해서 나는 두 와인의 블렌딩을 찾아봤다. 두 와인은 역동적인 블렌딩을 한다. 매년 조금씩 포도 품종의 블렌딩 비율을 바꾼다. 찾아보니 세냐 2014 블렌딩은 까베르네 소비뇽 60%, 까르메네르 16%, 말벡 11%, 메를로 8%, 쁘띠 베르도 5%다. 알마비바 2019는 카베르네 소비뇽 65%, 카르메네르 23%, 카베르네 프랑 5%, 쁘띠 베르도와 멜롯이 각각 1%로 구성됐다. 결론적으로 두 와인의 품종 블렌딩은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다. 세냐가 좀 더 병렬적인 브렌딩을, 알마비바가 특정 품종의 비율이 높다는 것(카베르네 쇼비뇽과 카르미네르 비율이 90%에 가깝다) 정도였다.
어쩌면 두 와인의 차이는 세냐가 미국 로버트 몬다비와, 알마비바가 프랑스 바롱 드 필립 로쉴드와 손을 잡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싶다. 세냐가 좀 더 발랄하고 알마비바가 좀 더 무거운 것은 두 합작사의 양조 철학뿐 아니라 두 국가 와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로버트 몬다비는 “와인은 열정(Wine is passion)”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또 와인은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뭔가 미국적이면서도 원칙적이다. 바롱 드 필립 로칠드의 철학은 “조화, 성실, 기술”이다. 도멘 바롱 드 로칠드(Domaines Barons de Rothschild)의 CEO는 2015년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대한 와인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찬미의 글을 쓰게 하고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럭셔리를 넘어선 위대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조철학이 좀 더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이나 국가별로 최고의 와인을 만나는 것은 분명 행운이다. 하지만 이런 와인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와인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영아살해’를 하지 말고 무조건 10~20여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고자세 탓에 젊은이들이 와인을 어렵다며 맥주나 무알코올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와인 메이커들은 권위를 내려놓고 누구든 쉽게 와인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양조를 해야 한다. 침용 기간을 줄이고, 타닌을 낮추고, 오크 숙성을 가볍게 한 고품질의 와인이란 ‘동그란 네모’라는 표현처럼 모순형용일까?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인의 영아살해를 이제 그만 지켜보고 싶지 않을까?
권은중 전문기자는 <한겨레> <문화일보> 기자로 20여 년 일하다 50세에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외국인을 위한 이탈리아 요리학교(ICIF)’에 유학을 다녀왔다. 귀국 후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음식과 와인 칼럼을 써왔고, 관련 강연을 해왔다. 『와인은 참치 마요』, 『파스타에서 이탈리아를 맛보다』 등의 저서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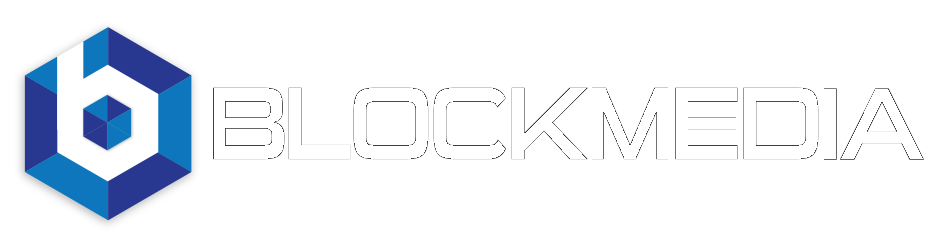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칠레 최고 와인을 ‘살해’하다 [권은중의 와인이야기] 칠레 최고 와인을 ‘살해’하다](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smush-webp/2026/04/theme-photos-mR_lv_G7XCY-unsplash-1200x1800.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