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프로젝트마다 수익성과 유동성, 성장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스테이크하우스 파이낸셜(Steakhouse Financial)은 USDT(테더), USDC(유에스디시코인), USDS(유에스디에스)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재무 구조를 분석해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다른 수익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했다.
USDC는 유동성을 우선한 완전 준비금 모델로, 은행 예금과 단기 국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 반면, USDT와 USDS는 부분 준비금 모델로 고수익 자산에 일부를 투자하며 수익성을 높인다. 이 모델은 서로 다른 사용자 수요와 시장 기능을 겨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지속가능성은 자산 대비 수익률(ROE)로 평가할 수 있다. 완전 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은 이자 수익만으로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API 서비스, 거래 수수료, 신용 상품 등 비이자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서클(Circle)은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SDK 기반 결제 솔루션 ‘USDCkit’을 통해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테더(Tether)와 스카이(Sky)는 유동성 일부를 희생하고 고수익 자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테더는 2024년 7%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기 국채와 준비금만으로는 어렵다는 평가다.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미실현 손익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카이는 온체인 기반으로 사용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USDS를 발행하고 다시 대출이나 투자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창출한다.
테더는 2022년 이후 은행 예금을 줄이며 유동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조절했다. 스카이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이탈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자산 만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통 금융의 예대금리 모델과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클은 국채 중심의 안전한 자산을 유지하지만 수익성은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트너사 중심 플랫폼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자산군으로, 상장된 기업이 드물고 회계 기준도 다양해 명확한 밸류에이션 지표가 없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 시도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구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이로 인해 각 프로젝트는 다른 시장과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단순한 페깅 유지 외에도 구조적 수익성과 유동성 관리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3일, 15:1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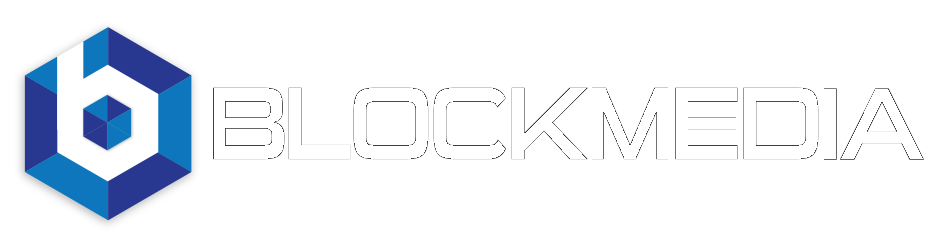



![[주요 뉴스] 스테이블코인, 수익성과 유동성 균형 다양한 모델로 지속가능성 추구 [주요 뉴스] 스테이블코인, 수익성과 유동성 균형 다양한 모델로 지속가능성 추구](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5/04/6d9a647a-2a91-43db-ab40-c153f321f239_1456x1048-1200x864.webp)